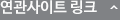"삼성 있을 땐 몰랐는데 화웨이 다녀보니 무섭더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산 작성일25-07-24 10:59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삼성 있을 땐 몰랐는데 화웨이 다녀보니 무섭더라"(조선일보 경제포커스)
미래를 보려면 실리콘밸리 대신
중국 화웨이를 보라는 세상이다
일본이 한국을 배우자고 했듯
우리도 중국 배우기에 나서야
입력 2025.07.23. 23:54
이준호(58) 부사장은 중국 화웨이의 한국 법인 CSO(보안 최고 임원) 5년 차다. 삼성 출신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네이버의 임원을 거쳐 2020년 화웨이에 합류했다. 중국 IT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에 대해 들어보려 만났다. “한국이 걱정스럽다”는 얘기부터 했다.
그는 “상당수 한국인은 중국의 질주를 보면서도 ‘중국은 별거 아닐 거야’라며 애써 부정한다”고 했다. 이어폰 하나를 꺼냈다. 귀에 꽂으니 착용감이나 성능은 물론 가격대(27만원 안팎) 모두 삼성이나 애플 제품을 능가했다. 화웨이 신제품이었다. ‘996’ 얘기로 이어졌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그는 “화웨이뿐 아니라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통상 996으로 일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전 임원은 ‘996이 뭐냐. 나는 알리바바 다닐 때 007(퇴근 없이 주 7일 근무)로 일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전했다.
주 52시간도 부족해 주 4일을 외치는 한국에서 근면성 강조는 시대착오 아닐까. 그는 “나도 삼성, 네이버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국 회사 다녀보니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봉쇄 조치’를 불과 4~5년 만에 대부분 극복한 힘도 이런 데서 나온다고 했다. “화웨이처럼 안 하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겠나”라는 그의 반문이었다. 화웨이 한국 법인에서 최고령자인 그는 “사장은 40대 초반이고, 45세 이상은 거의 없다. 한창때 미친 듯 일하자는 게 화웨이 문화”라고 했다.
중국 둥관의 화웨이 연구·개발(R&D) 캠퍼스 동영상을 보여줬다. 여의도 절반 크기(180만㎡) 터에서 연구원 3만명, 지원 인력 5000명이 일한다. 호수를 배경으로 들어선 빨간 지붕의 유럽 고성 같은 건물 수십 동은 테마파크를 연상케 했다. 연구동을 이동할 때는 트램(기차)을 탄다. 화웨이 전체 R&D 인력은 11만명(직원의 55%),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만 200조원. 이런 곳이 996의 현장이라니 말문이 막혔다.
미래 전략이란 주제로 이어졌다.
“한국은 지금 경쟁자를 못 찾는 듯하다.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이 ‘미래 경쟁자는 화웨이’라고 지목했다. 한국인들은 화웨이를 통신 장비나 휴대폰 업체로 알고, 중국 정부 덕분에 크는 기업 정도로 생각한다. 화웨이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라. 스마트폰, 통신 장비 등은 물론 자율주행 시스템에다 네트워크, 컴퓨팅, 클라우드에 전기 저장 장치 사업까지 한다.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고, AI 생태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걸 미국이 봤고, 젠슨 황이 본 것이다.”
짝퉁의 나라가 순식간에 세계 최고 기술 나라가 됐다. 우리가 알던 중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AI(인공지능) 딥시크도 놀랍지만 드론(세계 시장 점유율 70%), 전기차(60%), 이차 전지(68%), 로봇(40%) 등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분야에서 모두 수퍼 파워다. 미국이 두려워할 만하다.
중국에는 투명성, 청렴성 문제 등 후진적 요소가 많다. ‘독재국가에 대한 민주국가의 우월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래 준비’에선 완전 다른 얘기다. 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예전엔 미래를 보려고 실리콘밸리를 찾았다면 이젠 화웨이를 보라”고 했을 정도다. 이젠 우리가 배울 대상은 중국인 듯하다. 우리 사회 모두가 중국처럼 하자는 게 아니다. 글로벌 경쟁 분야만이라도 중국 따라 해보기에 나서는 건 어떤가. “십수 년 전 일본이 한국을 배우자고 한 것처럼 이제 한국도 중국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요.” 그가 인터뷰 말미에 한 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